
마법의 램프를 쓰다듬으며 내는 주문 같은 제목을 지그시 보다가 문득 뭐라도 빌고 싶다는 생각을 피워 올렸다.
타이포그래피의 감각적 편집 디자인은 칭찬할만 한데 글자 크기는 애로적이었다. 불편해서 안 쓰던 안경을 다시 써야 했고 같은 문단을 반복해야 해서 읽느라 리듬도 깨졌다. 독자에 대한 배려, 좀 부족했다. 나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숨도 쉬지 않고 속을 게워내는 것처럼, 속사포 랩을 구사하는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작가는 마음을 쏟아낸다. 근데 그걸 주워 읽기만 했는데 희한하게 위로가 된다. 작가가 말한 것처럼 일면식도 없이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서로를 응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눈에 가슴에 쿡 박히는 문장.
"잘라 버릴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인들도 유심히 보고 함께 걸러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45쪽
타인에게 그것도 가까운 타인에게 호되게 데어 본 사람은 안다. 꼭 그래야 함을. 십 년 가까이 친형처럼 따랐던 사람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맞았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도 안 나더라. 문득 그때의 분함이 치솟았지만 잘라내버린 일은 잘한 일이라고 위로받은 기분이 든다.

'똑같다'라는 하루의 의미를 되짚는 작가의 말에 훗 하고 미소를 짓는다.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오래전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세상에 나왔고, 첫눈 내리던 그 해 크리스마스는 내가 준비해 간 커다란 토로로 인형을 등에 업고 그 애는 안녕을 고하고 총총히 사라졌다. 어찌 다 같은 날이겠는가. 모든 하루가 동등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루가 달라서 특별할지도 모른다. 그 특별함을 팍팍한 현실이 보통의 날로 탈바꿈 시켜 버린 걸 눈치채지 못했을 따름일지도.
'사람이 변하며 죽는다'니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다기보다 그냥 안 변하는 게 낫지 싶다. 죽는다는 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끝에 너나 내가 아닌 '사람 사이'가 변하는 거란 작가의 말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라는 게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대상에 따라 가깝기도 멀기도 할 테니 그 또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이가 천양지차이지 않을까. 나는 친하다 생각하지만 상대는 가까운 정도로, 나는 서먹하다 생각하는데 상대는 친근한 사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린 다 각자의 착각으로 사이를 정하는 게 아닐까. 친구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아가 부탁과 거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각 많아지는 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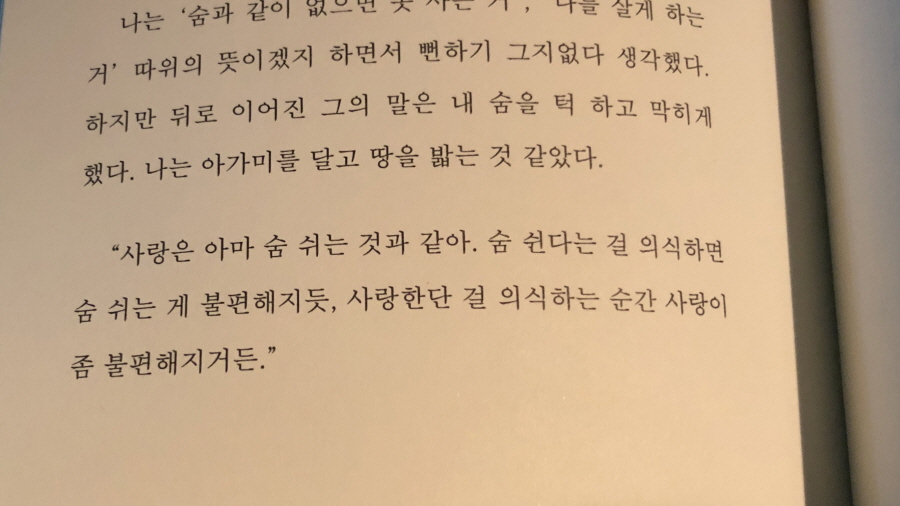
나는 이 책을 읽은 만큼 예쁜 마음이 한 뼘만큼 자라 예쁜 말들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완독 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마음가는데로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세이/낭독리뷰] 나는 가끔 내가 싫다가도 애틋해서 (0) | 2021.08.10 |
|---|---|
| [에세이] 나는 철없는 변호사입니다 (0) | 2021.08.07 |
| [에세이/낭독리뷰] 그 순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나였다 (0) | 2021.08.04 |
| [에세이/낭독리뷰]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0) | 2021.08.01 |
| [자기계발/낭독리뷰] 서재의 마법 (특별판 리커버 에디션) - 지식 세대를 위한 좋은 독서, 탁월한 독서, 위대한 독서법 (0) | 2021.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