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쓸쓸한 분위기의 노래라서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달콤하고 묵직하고, 음미할 수 있는 아픔이었다." p24
문장은 열한 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감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왔다 갔다 널뛰는 엄마의 감정만큼 윌라의 감정은 깊숙이 침잠했으리라. 그렇게 십대의 월라를 읽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리고 윌라는 스물한 살이 됐다. 흡입력 있게 몰아치던 윌라의 인생이 갑자기 약간 혼란스러워졌다. 왜? 1997이지? 윌라의 삼십 대, 그러니까 1987은 어쩌고? 결국 학교를 채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데릭과 진짜 결혼이라도 한 걸까? 앞날이 창창한 전액 장학생 신분을 버리고? 그러질 않길 바라며 조바심이 났다.
이 책은 엄마에게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정서를 윌라와 일레인의 어린 시절, 동시에 윌라의 아들들, 션과 이안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로 보여주는 듯하다. 어쩌면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관계가 황량한 사막의 건조함만큼이나 메말라 만지면 바스러질 것 같았다. 읽는 내내 윌라의 가족은 위태로웠고, 소설은 시도 때도 없이 널뛰는 감정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 감정의 균형 위에서 애쓰는 윌라의 삶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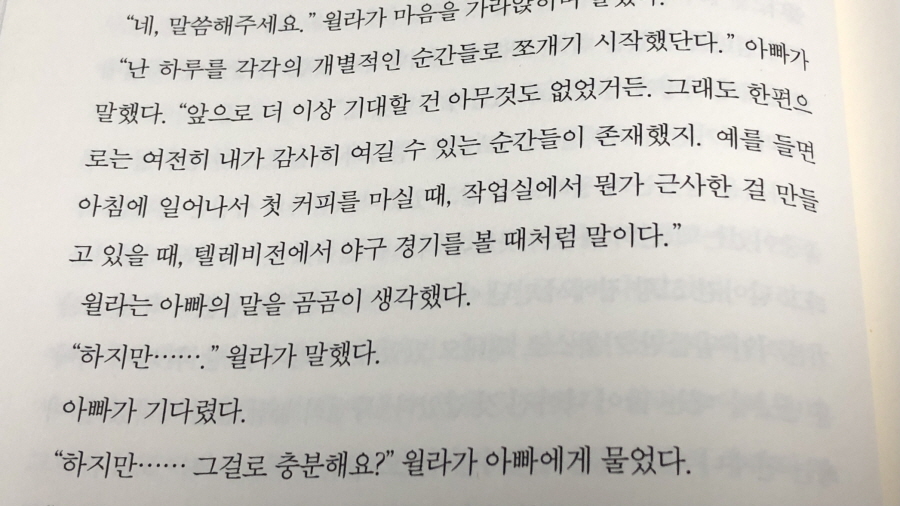
상실에 대처하는, 그것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분명 '감당'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윌라가 데릭을 잃은 상실에서 힘겨워 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헤맬 때, 엄마를 잃었다는 일은 그저 버텨야 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아빠의 말은 경험이 없는 내게도 깊은 침잠으로 다가선다. "시간을 순간들로 쪼개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다"니… 그건 시간이 멈춰버린 것과 무엇이 다를까.
"여기 사는 우리들 모두가 혼자 사는 것 같아요." p236
솔직히 예순하나가 된 월라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오지라퍼도 이 정도면 환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이 문장을 맞닥뜨린 순간 멈칫했다. 우린 기족과 이웃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외로운 존재가 아닐까 싶었다. 그러자 윌라가 그래야만 했던 건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어쩌면 윌라는 오래전, 그러니까 엄마에게 마음을 숨기고 이쁨을 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위축되었던 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먼저 지레짐작하고 때론 배려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일단 숨기는 게 익숙해졌으리라 짐작되니 안쓰러웠다.
여러 생각이 드는 소설이다. 잔잔하다 못해 하품이 날 지경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윌라를 둘러싼 일들은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없다. 션이나 이안의 무심함이 괘씸하지만 또 나름 그들은 그들대로 유년 시절의 아픔이 있고, 피터 역시 역할이 구분된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한 드니즈나 셰릴도 딱히 그녀의 인생에 이렇다 할 활력소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그래서 작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윌라에게 묻는 벤의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가족은 무엇인지, 또 가족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윌라처럼 헌신만 하며 살고 있는지 묻는 듯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눈치채지 못한 순간 새로운 가족처럼 된 드니즈와 셰릴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미도 묻는다. 과연 혈연이 가족인지 식구가 가족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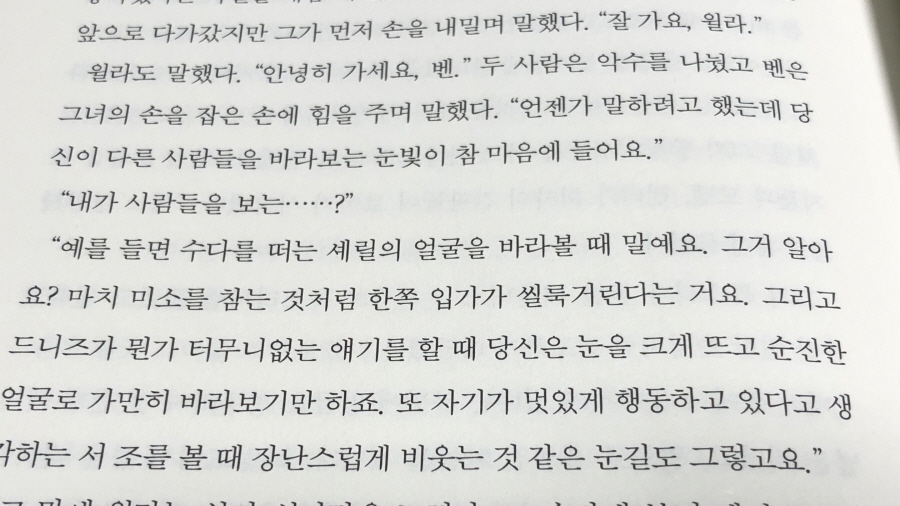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 어떤 표정일지 걱정됐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 애정을 표정이나 눈빛에 담는 일은 꼭 가족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린 살면서 그런 표정이나 눈빛을 발산하며 살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잊고 사는 건 아닐까.
끝났다. 지금 이 기분을 표현하긴 해야 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솔직히 호평 일색인 추천평처럼 감동적이거나 희망적이라거나 하진 않았다. 보통의 미국인들의 일상을 몰라서 그렇다고 쳐야겠다. 다만 극심한 이타 주의자인 윌라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고 그런 그의 감정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자극하는 인물들의 수고로움이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에서 느리지만 비로소 자기 삶을 찾아내는 그를 통해 인생의 방향이 직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사랑이 전부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린 상대가 익숙한 것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수준 낮지만 굳이 표현해보면, 볼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지퍼를 올려야 하는 다급함이랄까. 벤의 발목까지 올라오는 스니커즈를 보고 느낀 연정도, 셰릴의 당돌함 뒤에 묻어나는 애정도 뒤로한 채 윌라가 갑자기 바꾼 방향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소설은 끝나 버렸다. 황망했지만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
윌라가 삶을 유지하려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긴장의 끈이 한순간 툭하고 맥없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랬다. 마치 무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며 회전하다 끝에서 펑 하고 사라지는? 아! 그래서 월라의 인생이 클락 댄스였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마음가는데로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기계발/낭독리뷰] 200가지 고민에 대한 마법의 명언 - 걱정인형처럼 내 고민을 털어놓는 책 (0) | 2021.02.19 |
|---|---|
| [자기계발/낭독리뷰] 마음챙김의 인문학 - 하루 10분 당신의 고요를 위한 시간 (0) | 2021.02.18 |
| [에세이]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오십이 되었다 - ‘척’에 숨긴 내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 (0) | 2021.02.05 |
| [자기계발/심리]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특별판 리커버 에디션, 양장) -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심리법칙 75 (0) | 2021.02.02 |
| [고전/철학] 삶이 무거울 때 채근담을 읽는다 (0) | 2021.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