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팔하던 스무 살에 느닷없이 목이 부러져 사경을 헤매다 요만큼이라도 사는 맛을 보고 있는 나로서는 제목이 좀 뻔했다. 역경이란 단어가 눈에 꽂혀, 누가 인생 좀 고달파져 이러쿵저러쿵 일장연설하고 싶었나 보다 했다. 거기다 왠지 거칠지 못한 사람이 거칠어 보이려 애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재치 있는 라임이 살아 있는 말장난이 되려 더 씁쓸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 뻔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읽고 싶었던 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나도 덩달아 웃고 싶어서 였을지도 모르고.
훈남에 팔방미인이라는 작가 본인을 비롯한 가족사는 듣기만 해도 급피로에 우울감이 전해졌다. 이렇게 재난에 가까운 일들에 무너지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마음 근육은 도대체 얼마나 두꺼울까 싶다. 기분이 묘하다. 내 마음 근육은 습자지 정도가 아닐까.
나도 생긴 거는 작가에게(일면식이 없어 정확하진 않다) 밀리지 않을 만큼 훈남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스무 살에 손가락 하나 딸싹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에크모로 연명하는 처지였던 터라 작가의 질병사는 남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34년을 버티고 있는 지금은 휠체어라도 탈 수 있게 됐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사는 작가 못지 않은데 그와는 다르게 나는 입만 열면 사오정이 나방을 내뿜듯 불평불만을 쏟아 내며 산다. 오죽하면 한때 투덜이 스머프에 염세주의자라고 친구들이 놀렸다. 그렇게 달라서 부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역경이 싸대기를 날리면 나는 웃기는커녕 입에서 불을 내뿜을 텐데 말이다.

읽다 보니 어떻게든 잘 살아 보겠다고 욕망 덩어리가 되느니 뭐라도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정신건강에 특효약이 아닐까 싶다. 그게 작가의 처방전이었을 게 뻔하다. 그의 지난한 가족사에서 유독 한 인물이 생동감 있게 그려졌다. 멈칫 한순간, 내 인생사로 옮겨 왔다. 가슴이 떨렸다.
우직한 소처럼 가족을 위해 일만 하느라 손이 무르고 터지고 마디마디가 다 휜, 그래서 조카 결혼식에서 조차도 자신의 못난 손을 가리고 싶어 혼주 장갑을 빌려야 마음을 놓는 엄마를 술만 마시면 욕하고 패던 사람. 눈을 뜨고 있으면 덩달아 맞아 부르르 떨면서 꼭 감았던 나와 동생들. 366일을 술에 찌들어 무능력한 데 빚까지 얹어준 사람. 그리고 목이 부러져 숨도 못 쉬는 아들 보다 병원비 걱정이었던, 그래서 포기하자고 스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이 내 아빠였다. 최면이라도 걸면 아빠와 따뜻한 기억이 있을까. 원래 아픔은 배틀 하는 게 아닌데 쓰고 보니 그리 생각될까 조심스럽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다.
그런 아버지가 선명해질 때쯤 작가가 던지는 가족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장이 멎고 머리가 하얘졌다. 작가가 폭력을 일삼고 무지막지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아니 왜 용서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내 아버지 역시 치매로 점점 기억을 잃어 가고 있기에 심란한 마음이 없지 않아서 그의 이야기를 빨려들 듯 읽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가 이해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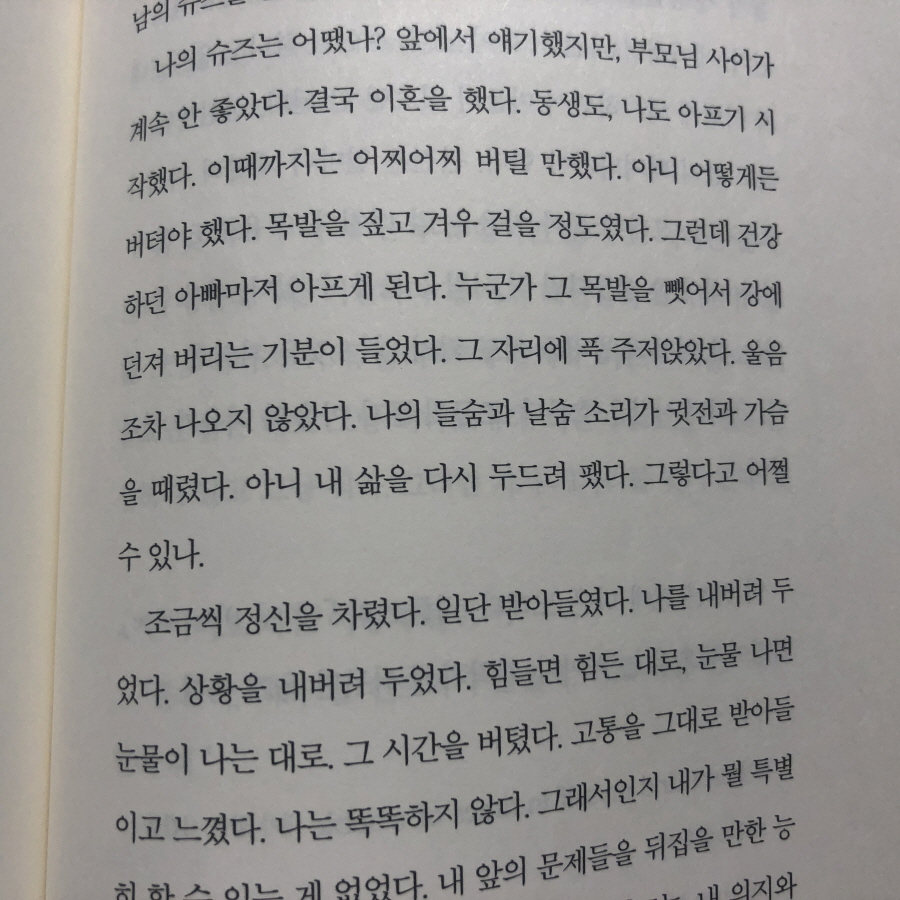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고단함을 어찌 속속들이 알겠냐마는, 다만 지쳤다고 표현해도 될 일을 부러 안 그런 척 씩씩한 척 가면 뒤에 숨겨놓다가 곪을까 걱정된다. 부디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자주 쌓이고 쌓여 상처와 고단함이 조금은 덜어지길 바란다. 그는 그래도 된다.
내용 중에,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면 입 닥치는 게 위로라는 작가의 말에 백만 번 공감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 느끼는 대미지는 모두 다를 테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맞다. 어설픈 위로와 공감은 공허할 뿐이다. 그저 잘 버텨주고 있으니 다행이랄 밖에.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마음가는데로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설] 이래 봬도 대학 나온,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0) | 2023.06.28 |
|---|---|
| [자기계발] 고민 해결이 필요할 땐 이 책, 정신과 의사 TOMY가 알려주는 1초 만에 고민이 사라지는 말 (0) | 2023.06.20 |
| [인문]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 영혼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상흔을 치유하는 법 (0) | 2023.06.14 |
| [자기계발] 시간 연금술사 - 생각하는 대로 해내는 (3) | 2023.06.07 |
| [시] 이 여름이 우리의 첫사랑이니까 (0) | 2023.0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