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대박! 이리 간결하고 멋들어진 감정 표현이! '그지 같다'라며 출판사를 멕이는 강단에 제목만큼이나 이 책이 너무 흥미로워졌다. 감동적이기까지 하다면 오버스러운가?
정신을 놓고 단어의 꼬리를 물며 읽다 아내의 부름 소리가 귀에 날카롭게 박혀 번쩍 깬다. 어딜 읽었고 어딜 읽어야 하는지 당황한다.
"유두가 가슴의 전부인가. 유두를 감춰도 출렁거림과 풍성함은 감출 수 없을 텐데. 미소한 일부가 전체를 압도할 수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그 사람을 대표하니까." 31쪽
나는 이 대목에서 유두가 아닌 휠체어가 떠올랐다. 이런 특징으로 규정되는 게 소수자니까. 여성성을 거침없이 표현한 데서 마치 정체성을 부여받는 장애인이 도드라진다.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 특징은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말이다. 걷거나 타거나 가는 건 매한가지 아닌가.
내밀을 드러낸 글쓰기를 한다던, 그의 글은 확실히 거침없고 강단에 시니컬하기까지 하다. 한데 어쩌자고 우리는 이렇게 다정하냐는, 정말 어쩌자고 이렇게 설렘 한 문장까지 내던지는지 폭 빠져들게 만든다. 근데 정여울의 찐팬일까. 그의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자꾸 등장하는 그 역시 한 뼘은 친해진 느낌이다.
그가 필요하다는 비밀을 생각한다. 나는 숨어 숨 쉴 수 있는 비밀이 있던가. 마음은 계속 헝클어지는데 풀어낼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숨은 여전히 가쁘다. 그래서 나는 가난에 허덕이는가. 왠지 모르지만 빛이 들지 않는 높다란 건물 옆이나 뒤에 기대서서 나갈, 아니 나가도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가 상상됐다.
아, 짧게 탄식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샌다. 몰랐겠지. 몰랐으니 자신의 아픈 팔 무게를 빗대 '반절 남은 팔을 달고 다닌' 다거나 '나오다만 것 같은 소프트아이스크림'같은 표현을 멋부려 고르진 않았겠지. 그랬을 거야. 워낙 장애를 모르니. 그걸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기분이 어떤지 모를 테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가 그래도 옆구리 한쪽이 서럽게 시린 걸 참기 힘들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내와 웃으며 길을 갈 때도 사람들은 그랬겠구나, 천천히 느릿하게 복기된다. '웃을 일이 있겠다' 라니, '저럴 수도 있구나' 라니. 뒤늦은 위로 글은 위로가 되질 않는다. 왜 우린 모습이 다르다고 사는 모습도 다르다고 생각할까. 얼마 전 읽은 장애아 부모들의 이야기 <오늘을 견디며, 사랑하며>의 한 대목 '웃음이 나와?'라며 무조건 힘들어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적하는 내용이 겹쳐진다. 책을 잠시 덮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게 된다. 괜찮지 않다고 말한다고 괜찮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 버리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한층 고단해지는 일이 될 테니까. 나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게 된다." 145쪽
꽤나 시니컬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작가의 이 말에 "진짜?" 그랬다. 상대방의 감정은 괘념치 않고 툭 하고 순간의 감정을 던지는 사람일 거 같았는데. 오십이 넘어서도 아직까지 사람 볼 줄 모른다던 아내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하기야 나도 이런 부류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고단해진다는 그의 감정을 알 것 같아서 덩달아 기분이 가라앉는다.
사라지는 것, 다른 의미로 상실에 대한 그의 이야기 속 엄마의 부재는 왠지 슬프지 않았다. 이유는 모른다. 그저 담담하게 읊조리듯 상실이 아닌 아버지 머리맡 토트백 존재로 읽혀서 그런가. 암튼 그의 문체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단어처럼 아니면 단어의 유희처럼 독특하다. 운율처럼 리듬감도 좀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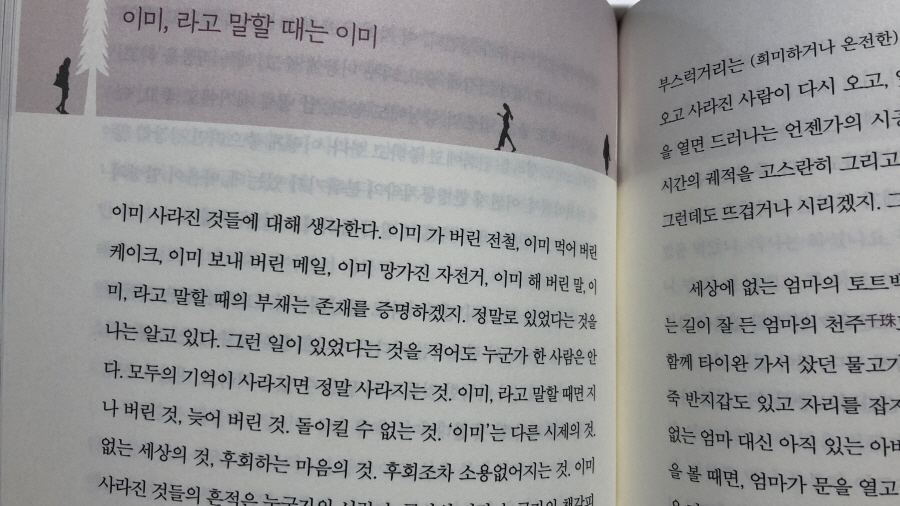
중간중간 그의 눈에 비친 장애가 툭툭 튀어나온다. 전혀 예기치 않은 지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시각 장애인의 대필 글을 썼을 때 그의 감정과 감각은 다른 페이지의 것들과는 사뭇 달랐다.
눈이 내리던 날 잠시 눈을 감고 차가운 벽을, 도시의 소음을, 손위에서 녹아 없어지는 눈을 감각하며 '어제와 같은 오늘, 지금까지와 같은 이후라는 것이 큰 안심이 되었다'라는 말이 가슴을 휘저었다. 중도 장애인인 내가 뼈에 사무치던 어제와 다른 오늘을 겪었던 1990년 6월이 새겨졌다.

참 매력적인 책인데, 아니 작가가 그런가. 아무튼 간에 뭐라 딱 잘라 표현할 방법을, 아니 단어를 찾지 못했다. 그나저나 이 책이 놀라운 건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책들을 내놓는지다. 실로 엄청난 작가와 책들이 소개된다. 노력한 걸까. 아니겠지. 이 정도는 기본 아녜요, 라고 할 것 같아서 기가 팍 죽는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자 사람과 나누고 싶었을까. 남자 사람인 내가 읽어도 그만한 공감은 나눌만한데.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마음가는데로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설] 월 200도 못 벌면서 집부터 산 31살 이서기 이야기 (2) | 2021.12.26 |
|---|---|
| [사회학] 당신이 혹하는 사이 -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부정된다 (0) | 2021.12.24 |
| [경제경영] 아마존 언바운드 -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글로벌 제국의 발명 (0) | 2021.12.19 |
| [소설] 모든 빗방울의 이름을 알았다 (0) | 2021.12.18 |
| [자기계발]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 인문학 (0) | 2021.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