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대 법의학 교수이자 법의학 연구소 소장인 저자가 산자의 시선으로 죽은 자를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학'의 시선에서 인간에 관한 삶과 죽음을 이야기 한다.
법의학은 죽은 자의 억울함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더구나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싶었고, 심지어 법의학은 인권 옹호의 권리 존중 의학이라 힘주어 말하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다. 한데 문득 죽은 자의 인권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다.
덧붙여 그가 하는 죽은 사람을 진료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의료 행위라는 말에서 '아직' 살아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듬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닐까 생각이 든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이기에 인간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의학은 인간의 죽음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다. 실재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18쪽
저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법의학의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고 법의학자는 몇 명이나 있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법의학과 관련한 이론적 분야를 한참을 세세하게 설명한다.
한데 이런 이야기가 모르는 분야라서 분명 흥미롭긴 한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이런 이론적 배경이나 필요성 등은 논문이 아닌 다음에야 몰입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 되려 달아오른 흥미와 기대를 냉장고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순간적으로 식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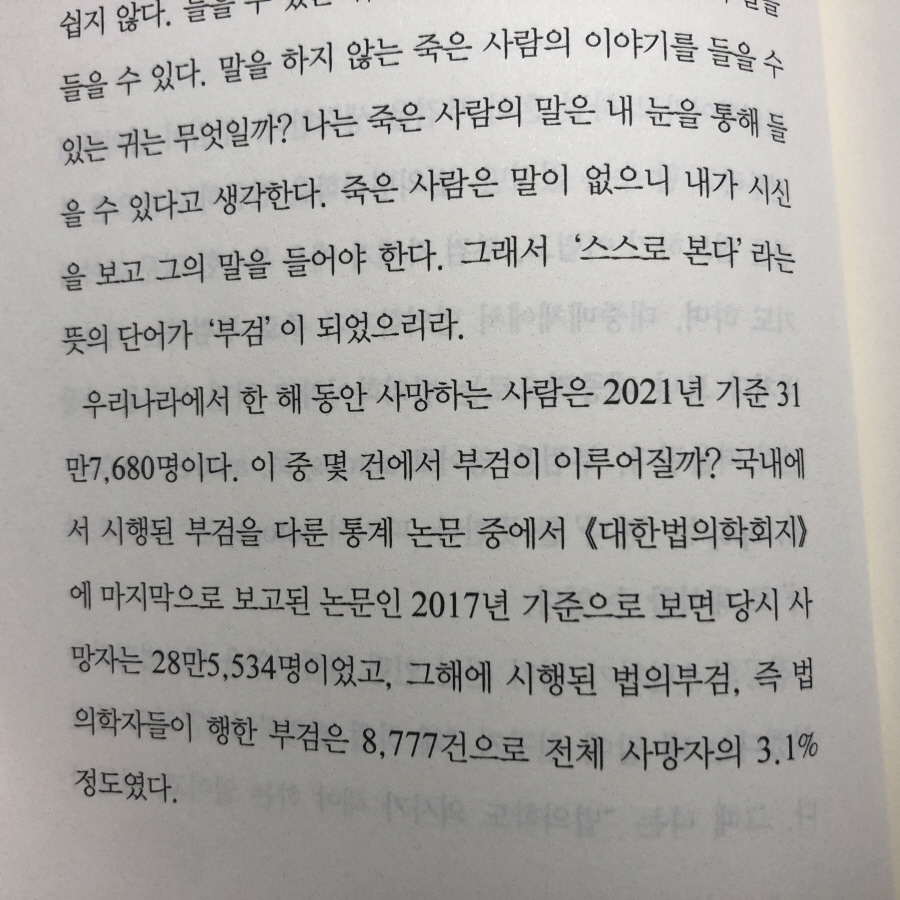
이후 다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데 다름 아닌 '부검'에 얽힌 이야기다. 보통 드라마나 뉴스 혹은 다큐에서나 듣보게 되는 부검은 영장 집행과 유가족 동의가 당연한 것처럼 묘사되는데 법적 부검은 유가족 동의가 무시된다고 하니 얼마간 놀랐다.
특히 국가가 책임지고 밝혀야 하는 변사에 11가지나 있다는 것이고, 그중 8번째 평소 건강해 보였으나 갑자기 죽는 청장년 및 노인 사망에서 '노인'이 포함된다는 게 확실히 의외다. 보통 사람들에게 노인의 돌연사는 어쩌면 당장 오늘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또, 생소한 단어인 두벌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저자의 마음이 제대로 읽혀 많이 공감된다. 부검은 "제대로 죽음의 사인을 밝히는 일 그래서 망자의 죽음을 산자의 앞날에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말에 설득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진 이야기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죽음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알고 나니 종이 한 장이 엄청 다른 무게를 지녔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한편으로 공감하게 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순간에 대한 출생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생각해 보게 한다.

마음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실제 하는 심장에 얽힌 내용과 그 심장을 막 빼낸 것처럼 들고 있는 엔리케 시모네의 그림 <부검>을 보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마음 편하게 감상하긴 쉽지 않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들로, 그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이유를 듣고 그 사유가 슬펐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분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하려는 이유는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는 뜻이 아니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137쪽
저자는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언급하는데 몇 년 전 친구가 의식이 없는 노모의 상태를 보며 초췌해져 가는 모습이 기억이 났다.
저자의 말처럼 치료를 중단하자니 몹쓸 자식이 되는 것 같고 주렁주렁 달린 기계에 의지해 연명하는 노모를 지켜 보자니 몹쓸 자식은 안 되더라도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일이다.
친구는 결국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지만 아무도 친구에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할 만큼 했다."라는 위로였는데 어디까지가 할 만큼 인지 생각하게 된다. 남은 인생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면 된 것일까?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쌓이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중단했다면 할 만큼 하지 않았던 걸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작성한다"라던 노인들의 마음을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돌봄이 오롯이 개인의 몫인 것처럼 그래야 효자, 효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효를 중시하는 훌륭한 문화처럼 만드는 국가의 돌봄 시스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가족 돌봄이라도 돌봄은 개인이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았으면 싶다.
알 수 없는 분야의 이야기가 흥미로워 홀딱 빠져들게 된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읽고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마음가는데로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세이] 학대 그리고 우울로 점철된 - 모든 계절의 흔적 (0) | 2024.02.16 |
|---|---|
| [육아] 찐 육아 에세이 - 좌충우돌 아빠의 일기장 (1) | 2024.02.14 |
| [아동] 모든 존재는 특별해요 - 그림책 추천 (2) | 2024.02.06 |
| [에세이] 인생 돌직구 처방전, 인생 공식 (0) | 2024.02.02 |
| [인문] 소멸도시 살리기 프로젝트, 사소한 이름 (0) | 2024.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