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광으로 빛나는 혈관 속을 유영하는 가오리가 눈에 선하다, 라는 말을 옮기려니 정신이 살짝 흐트러진다. 말 피와 플루오레세인을 수혈 받지 못함이 주는 결핍은 그를 예술에서 동질이 아닌 이질로 내몰았을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색이 선명한 소설이 된다.
그리고 '어차피'라는 말이 이렇게 처연해도 될까, 싶었다. 어느 매장의 매니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매니저가 낮게 읊조렸던 소리는 책 속에서 크게 터져 나왔다. 다들 돈 있는 만큼만 살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의 술 취한 음색은 귀에 대고 소리치는 아우성만큼이나 속을 헤집는다. 누구나 '어차피' 사는 건 그런 거겠지만 더럽게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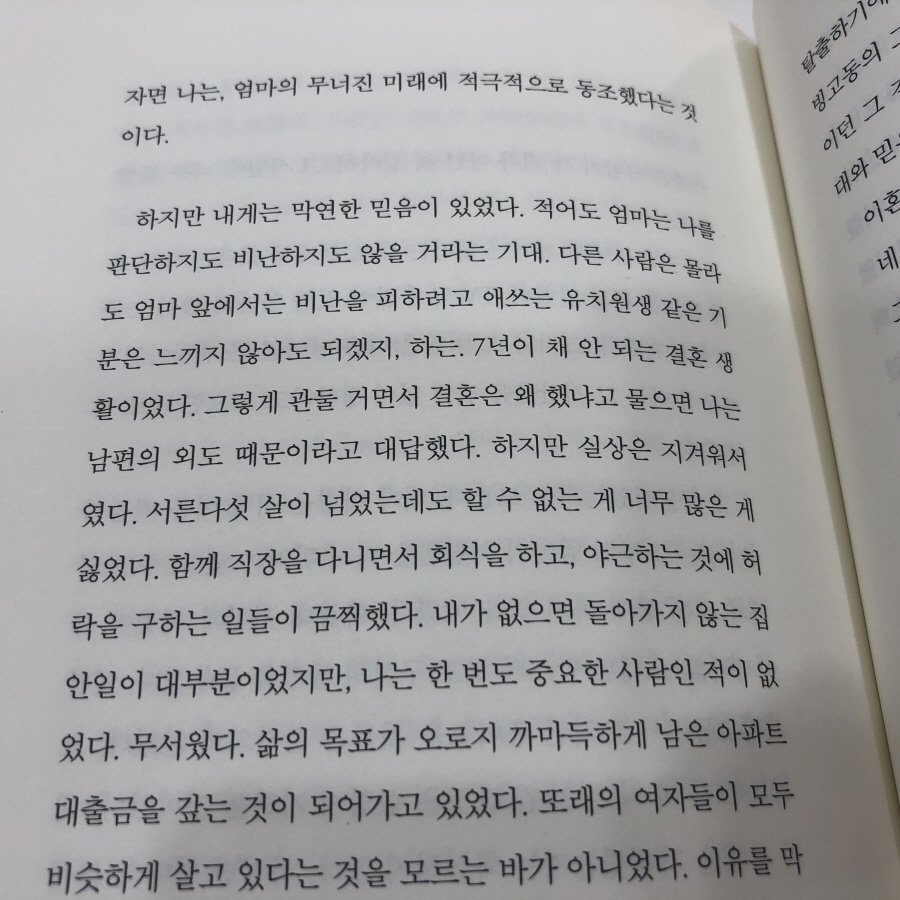
뭔가 되게 끈적한 죽음 앞에 놓인 유서를 읽은 듯한 <허들>은 뭔가를 분명 뛰어 넘어야 할 명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디에 놓인 울타리인지 가늠이 안 돼서 마음이 복잡하다. 엄마를 아빠를 남동생을 심지어 외숙모에 연주 언니도. '나'는 누구를 무엇을 뛰어 넘어야 유서를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걸까. 찾지 못한 문장은 완성 되어야 할까. 아 찝찝하다.
근데 그렇게 복잡해진 머릿 속에서 빛이 터져 올랐다. 4백 년 후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빛이려나? 이해하기 어려운 빛이 분명하다. 희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은 그런.
82년생 김지영이 게워내 듯, 남편이 외도를 했고 서른 다섯살이 넘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싫고 같이 일하는데도 야근과 회식의 허락을 구하는 게 끔찍하고 '내'가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지는데도 중요한 사람인 적이 없는 당연함과 남은 인생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다가 끝날 것 같은 일들은 결국 지겹다, 는 말로 날카롭게 날이 선다. 누구라도 베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런 가슴을 내리누르는 덩어리를 내보였는데 '네 새끼는?'이라며 엄마는 눈을 감았다. 어쩌면 어쩌면 혹시 집 나갔던 엄마는 엄마가 돌아와 다시 엄마가 되었을 그때의 엄마의 입장이 자신 때문이었다고 억울해 할지도 모른다는 엄마의 생각 끝에 다다라서 더 아프게 찔러댄 건 아니었을까.

소설은 둘 혹은 셋 아니 어쩌면 지독히 외로운 '나'를 만들어 내는 관계에서 버티다 버티다 삶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깊이 침잠하게 한다. 그리고 망설였던 해설은 결국 예상대로다. 암담하고 목구멍에 이물감이 가득해 뱉고 싶지만 나오지 않고 끈적하게 달라 붙은 것들에 대한 감상들을 순식간에 해설자의 감상으로 게워내지는 허탈감, 그건 정리는 되지만 깔끔하진 않은 느낌들이랄까.
하지만 때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날것의 감상이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뭐 그렇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완독 후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마음가는데로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연과학]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수학의 힘 - 수학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2) | 2023.01.05 |
|---|---|
| [에세이] 문장수집가 : No.3 Book Lover (0) | 2023.01.04 |
| [IT모바일] 실무에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데이터 분석 -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한 기초 통계 지식부터 엑셀 파워 쿼리 & 시각화 | 일잘러 시리즈 (0) | 2022.12.31 |
| [인문] 도쿄의 편집 - 에디터·크리에이터를 위한 편집력 강의 (0) | 2022.12.27 |
| [IT모바일] 엑셀로 시작하는 데이터과학 실무 (0) | 2022.12.24 |





